천사방성의 섬 제주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욕망
[신간] 강준 작가의『말은 욕망하지 않는다』(문학나무, 2025)
헌마공신 김만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김만일이 말을 육성하고 우수한 혈통을 보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소설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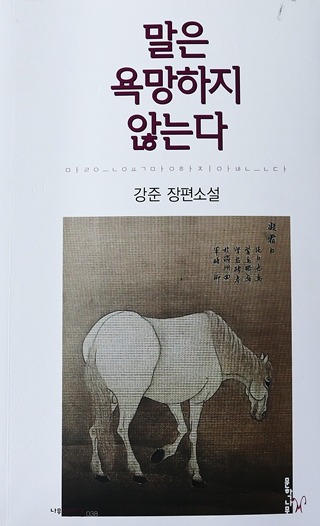
■ 출생
소설에서 중림 김만일은 경주김씨 말테우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가 돌아가시자 조부 꿈에 나타난 지관은 민오름 근처에 묘를 쓰면 손자가 큰 인물이 되겠다고 예언했다. 호종단의 설화와도 통하는 내용이다.
■ 결혼과 가정
제주목의 세력가 문서봉의 외동딸, 문미덕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중림은 그 집안의 사위가 됐고, 처가의 지원 아래 과거 공부를 했다. 그 와중에 장남 인걸, 차남 인호가 태어났다. 훗날 인걸은 훈을, 인호는 현을 낳았다.
중림에게 두 번째 부인이 될 처자가 찾아왔다. 성어진, 흥국사에서 만난 성찬륜의 딸이었다. 성어진은 아버지가 죽은 후 의귀로 와서 만일의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고, 결국 둘째 부인이 되어 셋째 아들 인철을 낳았다.
■ 첫 번째 벼슬
중림은 두 아들을 낳은 후 삼수 끝에 임오년(1582) 과거에 합격해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 순천도호부 방담진첨절제사’ 로 발령을 받았다. 부임지에게 병조참의 성창륜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찬륜은 제주도가 천사방성(天駟房星)이 비추는 말의 섬이고 천혜의 조건을 타고났다며, 왜놈들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어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후에 죽림의 두 번째 부인이 된다.
■ 말 육성
성창륜은 만난 후 중림은 전마(戰馬)를 기르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결정해 벼슬에 오른 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주목사를 만나 전마 육성 계획을 설명하고 초지에 사목장 만드는 일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죽마고우 소덕배의 도움을 받아 창고와 경비실, 기숙실, 마방 등 전마를 키우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지었다. 거기에 처가식구와 형제들을 불러들여 대창목장을 창업했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일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집 주위가 온통 말 천지였다. 말은 모두 여든여덟 마리였는데 색깔도 다양했다. 며칠 전 길에서 만난 백마가 끌어들인 것들이다. 대창마장에는 해가 갈수록 말 개체수가 늘어 중림은 부자가 됐다. 그릭 창업 4주년이 되는 해에 사저를 지었다.
■ 탐과오리의 횡포
집을 짓는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목관아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인근 다른 목장에서 만일이 다른 목장의 말을 훔쳤다고 모함해 벌이진 일인데, 탐욕스러운 판관은 죽림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 했다. 벌칙으로 말 여든여덟 마리를 바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점마관 양시훈이 왔는데, 공마 500필을 요구했다. 전마가 부족해사 씨수말, 암말까자 가져가려 했다. 씨수말은 절대 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게 임금의 교지였다. 중림은 은장도로 말의 눈을 찔러 씨수말을 보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적어 상소를 올렸다. 광해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 점마별관 양시훈, 제주목사 양휘, 대정현감 이삼 등을 한꺼번에 파직했다.

임진년에 왜군이 조선에 쳐들어왔다. 중림은 전마 200필을 바칠 결심을 했는데, 사복시(조정에서 말 목장을 관리하는 관청)에서는 이중에 100말을 보내라고 했다. 왜란이 끝나자 명에서는 전쟁에 대한 배상으로 말 1천 마리를 요구했다. 조정에서는 말 500필을 요청하고 공마선 14척과 사람 50명을 제주로 보냈다. 말이 공마선에 오르고, 중림과 아들 인호, 손자 현도 공마선에 올랐다. 이들은 제주를 떠난 지 33일 만에 한양 도성에 도착했다.
■ 두 번째 벼슬
광해 임금은 만일과 인걸, 인호, 현 네 사람을 궁 안으로 불러 치하했다. 중림에게는 정2품 벼슬인 오위도총부도총관 벼슬을 내렸다. 두 아들과 손자 현에게도 관직이 주어졌다. 만일은 궁에서 ‘섬에서 온 촌놈’이라고 대신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벼슬을 받은 지 80일 만에 사모관대를 벋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없어 광해 임금은 반정으로 쫓겨났다.
■ 애마 돌사니
돌사니는 중림이 과거시험에 합격하자 처가에서 선물로 내준 말이다. 돌산섬으로 부임하게 되자 이름을 돌사니로 지었다. 중림은 목장을 운영하는 중에도 늘 돌사니를 타고 다녔다. 그런 돌사니가 죽자, 중림은 이렇게 조문을 읽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나 영혼은 하늘에 올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때는 돌사니가 나가 되고 내가 돌사니가 되마. 고맙구나.”
중림이 죽을 때 돌사니가 마중나와 “주인님의 별 천사방성으로 가시죠.”라며 그를 태우고 하늘로 떠났다. 중림은 여든 살이 되던 해에 돌사니의 환영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서문에서 ‘욕망과 분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다. 중림에게는 좋은 말을 선발해 마장을 번성하게 하려는 욕망이 있다. 거기에는 가업과 국가를 융성하게 하려는 큰 뜻이 담겼다. 그런데 탐관오리, 그의 경쟁 업자들은 남이 가진 것을 탐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릇된 욕망으로 가득 찼다.
중림의 장남 인걸은 주색에 사로잡혀 아버지 속을 썩이는데, 차난 인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을 키우는데 열심을 낸다. 두 욕망은 작품 내내 충돌한다.
독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우선, 헌마공신 김만일이 유배 정객 간옹 이익(李瀷)의 장인이 된 일이 작품에 거론되지 않았다. 중림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다 제주인들과 의논하고 직접 상소를 올리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말에 전염병에 들자 주사를 놓았다는 대목도 시대와 맞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주사가 개발된 건 19세기의 일이다.
작가는 강연에서 헌마공신 김만일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했다. 그래서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적잖이 애를 먹었을 것이다. 그런 어러운 여건 하에서도 역사적 인물을 흔들어 깨워 바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돋보인다.
그리고 헛된 욕망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 김만일을 통해 중세 제주와 조선의 욕망을 조명한 작품에 감사하다.
<저작권자 ⓒ 서귀포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태욱 다른기사보기



